책 만드는 사람들은 출판업계를 ‘홍대 바닥’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곳에 많은 출판사가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 예술의 거리로 불리던 홍대의 옛 정취도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의미 있는 책의 가치를 전하고 싶습니다. 홍대 바닥에서 활동 중인 여섯 명의 출판인이 돌아가며 매주 한 권씩 책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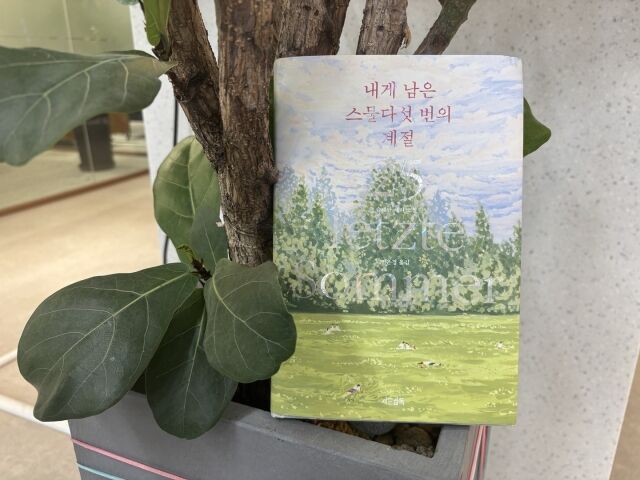
[북에디터 한성수] 어릴 적 친구가 오랜만에 카톡을 보내왔다. 반가운 마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던 중 톡 창에 충격적인 말이 떴다. “나 해고 통보 받았어.” 다행히 친구는 씩씩했다. 이 꼴 저 꼴 보는 게 괴로워 몇 달째 사표를 내야 하나 고민했는데 차라리 잘 됐다나. 친구는 지난 3년간 단 하루도 휴가를 써본 적 없다며 이참에 진지하게 창업을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대화는 그렇게 끝났지만 머리가 복잡했다. “잘했다, 뭘 해도 너라면 성공할 거다”며 온갖 말로 응원했지만 내심 괜찮을까 싶다. 내 문제라면? 과연 나라면 선뜻 독립선언을 할 수 있을까?
며칠이나 별별 생각으로 마음을 어지럽히다가 타이밍 좋게 <내게 남은 스물다섯 번의 계절>을 읽었다. 다 읽고는 한참을 멍하니 앉았다가 친구에게 톡을 남겼다. 읽다가 네 생각이 났다고, 그간 못 간 휴가도 챙길 겸 이 책 들고 여행이나 다녀오라고.
모르긴 몰라도 이 책을 읽은 사람 중 상당수는 제목에 낚였을 것이다. 하지만 작품 속에는 스물다섯이라는 숫자를 설명하는 장면이 없다. 유추할 만한 실마리도 나오지 않는다. 그저 스토리 중심축 ‘카를’ 입에서 딱 한 번 언급될 뿐이다. 그것도 아주 짧게. 그런데도 끝까지 읽고 나면 ‘그렇군’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그리고 묻게 된다. ‘나의 여름은?’
<내게 남은 스물다섯 번의 계절>의 화자 ‘나’는 학교를 졸업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바쁜 직장생활 중에 쪽 시간을 내 아이들을 돌보는 평범한 아빠다. 지금보다 더 잘살려면 절대 시간을 낭비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던 나는 6월 어느 주말 꼭두새벽에 시골 별장을 찾았다.
하지만 메일을 확인하느라 한순간도 휴대전화를 놓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며 어디선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한다. 이른 아침 호수를 바라보며 세상과 단절하고 싶다고 생각한 내 앞에 알몸으로 수영을 마친 카를이 나타났다. 그러곤 대뜸 묻는다. 당신도 아침 일찍 침대에서 굴러떨어졌느냐고. 나는 답했다. “아니요, 인생에서 굴러떨어졌답니다.”
카를은 한때 화가를 꿈꿨지만, 시키는 대로 그리지 않는다며 나쁜 점수를 준 선생 때문에 그림에 흥미를 잃고 일평생 감자를 키우며 살아왔다. 그의 구원은 호스피스 병동에서 환자들을 돌보던 아내였다. 아내가 카를에게 들려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마지막 질문이 그를 달라지게 했다. ‘나는 왜 나 자신의 삶을 살지 못했나?’, ‘나에게 정말 의미 있는 사람이나 일 대신 돈을 벌기 위한 일로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던가?’
인생에서 굴러떨어졌다는 나에게 카를은 자신처럼 알몸으로 호수에서 수영해 보라고 권한다. 나는 망설이다 물에 몸을 담갔다. 정말 오랜만에, 내가 나를 위해 한 자유로운 행동이었다. 바로 그 순간, 앞으로 남은 여름을 바꿀 특별한 이틀이 시작된다.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처음부터 내 손 안에 있었고, 다만 세상이 눈을 가려 보지 못했을 뿐이라는 걸 깨닫는 시간이었다.
어른이 되는 길목 어딘가에서 타인을 향한 순수한 호기심을 내던져 버리고, 허둥대며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정작 내 마음이 어떤지는 모르는 나에게 카를이 건넨 말.
“우리는 어떤 질문은 너무 적게 하고, 어떤 걱정은 너무 크게 해요.”
나태주 시인은 이 책을 ‘소설이지만 궁극에는 시’라고 평했다. ‘문장의 발걸음에 따라 마음이 조금씩 안정되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될 거’라는 그의 말에 정말 공감한다.
|북에디터 한성수. 내가 왜 이 일을 택했나 반평생 후회 속에 살았지만, 그래도 어느 동네서점이라도 발견하면 홀린 듯 들어가 종이 냄새 맡으며 좋다고 웃는 책쟁이.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