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위크|광진구=이민지 기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과 은둔 청년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요인으로 사회와 단절된 고립청년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이 7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주관한 ‘사회적 단절을 넘어 AI로 연결하는 청년복지의 미래’ 포럼이 5일 세종대학교 대양AI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해 AI 기반 청년복지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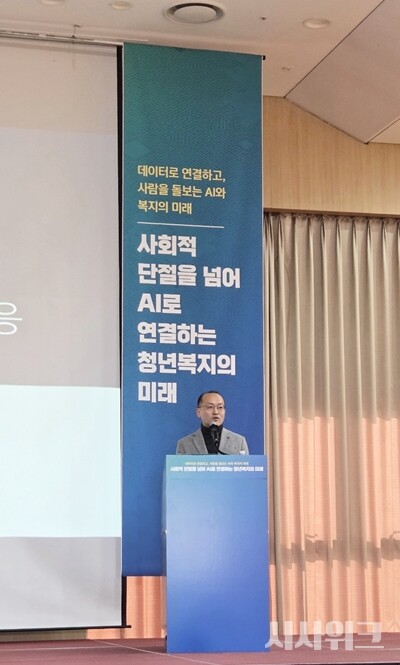
발표를 맡은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청년이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현상은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디지털 기술은 청년을 돕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기술로 인해 청년이 고립되는 문제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2023년 고립청년의 사회적 고립 비용 추계 연구를 진행한 내용을 보면, 약 7조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고립청년이 비고립청년과 동일하게 고용될 경우 창출될 수 있는 소득만 해도 6조7,000억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 고립은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 전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라며 “저출산과 고령화 등 복합적 요인과 얽히면서 영케어러의 사회적 위험 또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호서대학교 김혜원 교수는 고립은둔 청년의 회복을 돕는 구체적 사례로 사단법인 ‘PIE나다운청년들’의 ‘슬기로운 은둔생활’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김 교수는 “‘슬기로운 은둔생활’은 지원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이어져 온 프로그램으로, 참여자들의 높은 호응 덕분에 지속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줌(ZOOM)이나 네이버 밴드 등을 활용해 고립은둔 청년들이 약 3개월 동안 ‘방 청소하기’, ‘집밥 먹고 설거지하기’와 같은 간단한 미션을 수행하고 주 1회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세상과 공유하는 통로를 마련하고, 미션을 성공하면 편의점 쿠폰 등을 제공해 사회로의 첫 걸음을 가볍게 내딛을 수 있도록 돕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고립은둔 청년 지원 영역에서는 AI와 데이터가 △현황파악 △대상자 발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돌봄‧지원 △‘고립위기 대응 원스톱 시스템’ 통한 상담 등에 활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혜원 교수는 “본인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대상자 특성상 사생활 침해 문제를 비롯해 △민감정보 보안 △알고리즘 편향 △공감‧정서 교류의 한계 등 여러 문제와 부딪힐 수 밖에 없다”며 “정책의 중심을 AI가 아닌 ‘인간 중심 기술’로 두기 위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영케어러 당사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조기현 돌봄 커뮤니티 ‘N인분’ 대표는 “아버지를 돌보는 영케어러 당사자로서 AI 데이터 활용을 가장 긍정적으로 본다면, 내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필요를 파악해 적절한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역할일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돌봄 사각지대를 포괄할 수 있는 폭넓은 데이터 세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 “법적 근거가 없어 포함되지 못한 데이터가 많다”며 “이처럼 데이터에 반영되지 못한 당사자의 경험과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낼지가 향후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연구소 한상필 소장은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특화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기존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청년미래센터 등 관련 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며, 내년 중 1차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시사위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