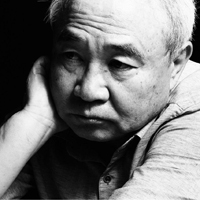
“아침에는 20분 동안 쉬지 않고 걸었다. 2,400보다. 1.8km를 시속 5.5km로 걸었다고 손목에 차고 있는 밴드가 알려주었다. 내일은 얼마나 빨리, 몇 킬로미터를 걸을 수 있을까. 기대된다. 가능하면 빨리 속도를 올려 100일 전처럼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씩씩하게 하고 싶다. 그래야 여름이 가기 전에 선자령이나 만항재에 꽃을 보러 갈 수 있으니까. 오후에는 물리치료 받고 걸어오다가 상태가 좋아진 것 같아 기분이 좋아서 예쁜 반바지 하나 샀다. 내일 치매로 고생하는 막냇동생에게 가면서 입고 갈 것이다.”
“뭐가 잘못된 걸까? 척추관협착증이 재발한 것 같다. 이번에는 걷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누울 수도 없다. 사람이 밤에도 눕지 못한다는 것, 평생 상상도 못 했던 일이다. 잠을 잘 때는 누어야 하는데 앉아만 있어야 한다니, 이건 분명 형벌이고 고문이다. 칠십 년 이상 살면서 지은 죄가 결코 작지 않으니 억울해도 감당할 수밖에…. 밤을 꼬박 뜬눈으로 새웠다. 짧은 여름밤이 누구에게는 매우 길 수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노인이 되고,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면서 배우는 게 많다. 사람은 좀 오래 살 필요가 있다. 일찍 죽어버리면, 늙으면 오래 사는 대가로 치러야 할 아픔도 많다는 걸 모르고 간다. 그러니 제대로 살고 가는 게 아니다.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몸이 운명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무슨 인용문이냐고? 지난주에 쓴 일기의 일부일세. 스물네 시간 사이에 사람의 처지가 극과 극을 치달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네. 노인이 되면 언제 무슨 일이 닥칠 줄 몰라.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들어. 기대대로 되는 것도 많지 않아. 몸과 마음도 내 뜻대로 통제할 수 없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와 수시로 맞닥뜨리는 게 인생이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되지.
지난 월요일 선자령에 다녀온 친구가 카톡으로 보내준 동자꽃을 보고 너무 반가웠네. 슬픈 전설을 지닌 꽃이지만 언제나 방긋방긋 웃고 있는 꽃이거든. 그래서 보는 사람도 함께 따라 웃을 수밖에 없어. 먼저 동자꽃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슬픈 이야기부터 들어 보게.
먼 옛날, 깊은 산 중 암자에 노스님과 동자승이 함께 살고 있었네. 겨울이 다가오던 어느 날 노스님은 먹을 것을 구하러 산 아래로 내려갔지. 하지만 하필 그날 눈이 많이 내려 다시 산으로 돌아올 수 없었네. 길에 쌓인 눈이 녹은 지 며칠 후 암자에 돌아와 보니 동자승은 산 아래를 내려다보는 자세로 죽어 있었네. 스님을 기다리다 배가 고파 죽은 거야. 그 후 동자승의 무덤에서 꽃이 피었는데, 그 꽃이 어린 동자의 얼굴과 비슷해서 ‘동자꽃’이라고 불렀다네. 동자꽃의 꽃말은 '지키지 못할 약속'이야. 여름에 깊은 산에서 주황색 동자꽃을 만나면 배고픔을 참아가며 노스님만 기다리던 동자승의 해맑은 얼굴을 떠올리기도 해. 반갑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지. 좋아하는 동자의 순수한 영혼이 깃든 꽃이야.
친구가 올린 선자령 동자꽃을 보니 마음이 급해지더군. 8월이 가면 볼 수 없거든. 다시 건강해져서 돈 벌어오라고 재촉하는 사람도 없는데 뭘 그렇게 서두르냐는 아내의 잔소리를 무시하고 아침 운동량을 크게 늘렸지. 하지만 걷는 시간과 속도를 동시에 올린 게 아직 무리였나 봐. 탈이 더 크게 났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증세가 더 심각해. 한쪽 다리가 찌릿찌릿 저리는 건 참을 수 있지만 밤낮으로 눕지 못하는 게 가장 큰 고통이었어. 앉아서 자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 그래서 지금까지 일부러 피했던 주사 치료를 시작했네. 이것도 효과가 없으면 수술할 수밖에 없다는군. 첫 번째 주사가 별 효과가 없어서 어제 두 번째 주사 치료를 받았네.
지난 며칠 아들과 며느리, 아내의 돌봄을 받으며 병원에 다녔네.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야. 언젠가 베레나 카스트의 『나이 든다는 것에 관하여』(김현정 옮김)에서 만났던 한 구절이 다시 떠오르더군.
“자립성의 상실은 신체 노화에서 비롯된다. 이는 우리 모두가 감수해야 하는 운명이다. 우리 몸은 언제나 우리의 운명이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튼튼하든 병에 잘 걸리든, 크든 작든, 뚱뚱하든 날씬하든, 똑똑하든 이해력이 조금 떨어지든, 우리는 우리 신체에 거의 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척추관협착증으로 고생하면서 “우리 몸은 언제나 우리의 운명이다”라는 카스트의 말을 계속 되새김질하고 있네. 분명 내가 갖고 있는 몸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게 화가 나기도 해. 몸이 자꾸 싸움을 걸고 내 의지를 시험하는 것만 같아서 괘씸하기도 하고. 하지만 어쩌겠는가. 자존심 상해도 내가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인 것을. 고장이 잦아지는 몸에게 화를 내도 아무 소용이 없는 짓인 것을…. 그러니 내가 먼저 백기를 들 수밖에. 남은 세월 자꾸 마음먹은 대로 움직여 주지 않는 몸도 또 다른‘나’로 받아들여 정성스레 길들이기로 했네. 좋으나 싫으나, 미우나 고우나, 그런 ‘나’도 오래 산 대가로 만난 소중한 친구이니 기꺼이 사랑하기로 작심했어. 그리고 다시는 서두르지 않을 걸세. 내년 여름에도 선자령과 만항재에 동자꽃은 해맑은 얼굴로 다시 필 테니까……
Copyright ⓒ 시사위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