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내 벤처투자시장에서 지역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창업 인프라와 자금이 수도권에 몰리면서 지방은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어도 '자금 절벽' 앞에 고립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망 스타트업조차 성장을 위해 서울로 '원정 IR'을 떠나야 하는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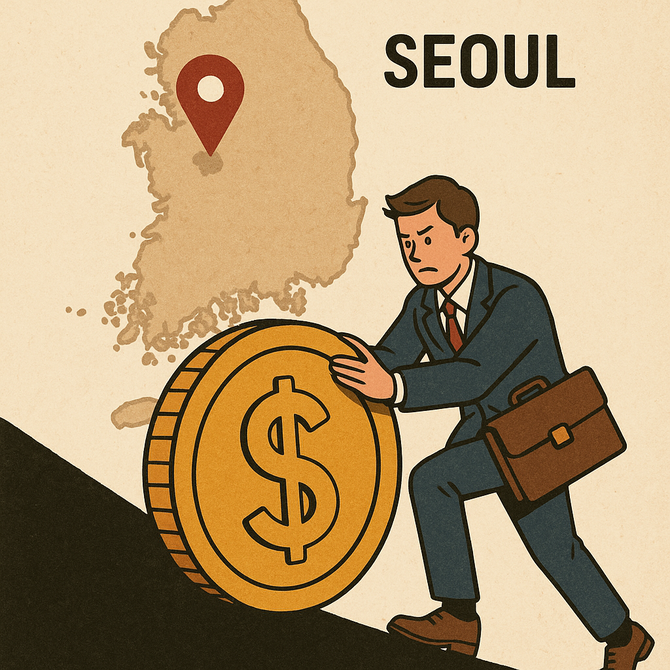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체 벤처기업의 40%가 비수도권에 자리 잡았지만, 이들이 받은 실제 투자 비중은 20%에 불과하다.
한국벤처투자(KVIC) 자료를 살펴봐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지난해 3월 기준 등록된 벤처투자사 402곳 중 350곳(87.3%)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 가운데 300곳이 서울에 몰려 있다. 사실상 투자 네트워크의 접점 자체가 수도권에 한정돼 있다는 얘기다.
대전에서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한 스타트업 대표는 "기술력을 인정받아도 투자자와의 연결은 결국 서울에서 이뤄진다"며 "투자 기회를 얻기 위해 결국 법인을 서울로 이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지역 창업이 곧 서울 이전으로 이어지는 '공식'이 된 셈이다. 민간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자금 흐름도 수도권 편중을 피하지 못했다. 모태펀드가 2005년 출범 이후 지난 2023년 8월까지 집행한 34조3000억원 가운데 지방 계정으로 배정된 금액은 1조1000억원, 전체의 3.2%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정부 출자금 9조9000억원 중 지방 몫은 1.2% 수준에 머물렀다. 지역별 펀드 격차 역시 뚜렷하다. 지난 2023년 기준 수도권 지역계정 펀드는 35개지만 강원·전북·충북 등은 고작 1~2개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유망 기업이 성장 국면에 들어서면 지방에 남기 어렵고, 본사를 서울로 이전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정부도 뒤늦게 균형 발전을 내세우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 강원·경북·부산·충남을 '지역모펀드' 운용 지자체로 선정했고, 충남은 이달부터 100억원 규모의 '기업성장 벤처펀드'를 가동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펀드 몇 개로는 불균형 해소가 어렵다"며 "운용사 자체가 지역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더브이씨(The VC) DB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1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지역 간 스타트업 이동은 711건에 달했다. 이 중 수도권은 유입보다 유출이 많아 순유출(205건)이 발생했지만, 정작 지방 기업의 이동 목적지는 대부분 수도권이었다. 충청권 창업기업의 84.4%, 강원권의 78.9%가 서울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 인구 이동 패턴과도 흡사하다.
산업별로 보면 고부가가치 산업일수록 수도권 집중 현상이 뚜렷했다. 헬스케어·콘텐츠·모빌리티 기업들은 인재와 자본, 기술 협력 생태계가 구축된 서울·충청으로 몰렸다. 반대로 농식품·그린에너지 분야는 지역 특화 산업과 지리적 요인에 따라 비수도권 내 이동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보고서에서 "지역 창업이 늘더라도 성장 단계에 접어들면 결국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며 "지역별 맞춤형 생태계를 조성해 성장 단계별 자원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투자금 분산'이 해답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자금뿐 아니라 투자 인프라와 의사결정 권한 자체를 지역에 두는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벤처투자 업계 관계자는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서울 자금을 억지로 지방에 흘려보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지역별 산업 특성과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다양성 중심' 투자 전략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