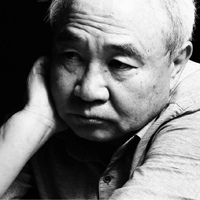
지난해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의 신작 산문집 『빛과 실』에 있는 수필 <북향 정원>을 흥미롭게 읽었네. 마흔여덟 살에 ‘열다섯 평 대지에 딸린 열 평 집’을 산 한강은 마당에 ‘가로 백팔십 센티미터, 세로 사십 센티미터의 긴 직사각형’ 정원을 만들었네. 하지만 북쪽 벽에 붙인 화단이라 종일 햇빛이 들지 않았어. 그래서 남쪽으로 비치는 햇빛을 8개의 거울로 반사시켜서 식물들에게 빛을 제공해야 했네.
“나무들에게 햇빛을 주는 날이면, 그 속력에 맞추기 위하여 꽤 바쁘게 하루를 보내야 한다.
모든 나무들에게 고루 빛을 쬐여주려면 여덟 개 거울의 각도와 위치를 약 십오 분에 한 번씩 옮겨주어야 한다.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의 감각을 그렇게 익히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지구가 공전하는 속도의 감각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었다. 계절에 따라 햇빛의 각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거울을 배치하는 위치를 약 사흘마다 조금씩 바꾸어야 한다.”
위 인용문을 읽으면서, 십오 분마다 글쓰기를 멈추고 마당에 나가 거울들의 각도와 위치를 바꾸고 있는 소설가의 모습을 떠올려 보게나. 마음이 찡하면서도 웃음이 나오지 않는가. ‘더 이상 포집할 빛이 없어질 때까지’ 거울들의 위치 바꾸기를 반복하면서도 많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해 주는 아름다운 글을 쓸 수 있다는 게 경이로울 뿐일세. <북향 정원>과 <정원 일기>를 읽는 내내 작가의 식물 사랑이 너무 아름다워서 내 가슴이 무지근해졌네.
그래서 어제는 책을 들고 옥상에 올라가 바닥에 가로와 세로가 각각 1.8m와 0.4m인 직사각형을 그려보았네. 한강이 만든 0.22 평의 작은 정원을 상상해 본 거야. 우리 옥상의 100분의 일 정도 되는 넓이더군. 새삼 내가 부자라는 걸 알았지. 그러니 화사하게 웃는 꽃들 에게 더 많은 석복수행(惜福修行)을 약속할 수밖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복에 감사하면서 더욱 겸손하게, 검소하게, 심플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어.
한강 작가는 작은 북향 정원에서 미스김라일락, 청단풍, 불두화, 옥잠화, 호스타, 맥문동 등을 키우면서 햇빛과 식물을 알고, “햇빛이 잎사귀를 통과할 때 생겨나는 투명한 연둣빛”을 볼 때마다 “식물과 공생해온 인간의 유전자에 새겨진 것이리라 짐작되는, 거의 근원적이라고 느껴지는 기쁨의 감각”을 느꼈다고 말했네. 나도 마찬가지야. 옥상에서 자라는 다양한 초록 식물들로부터 많은 기쁨을 얻고 있어.
우리 집 옥상은 한강의 ‘북향 정원’에 비하면 매우 넓은 대농장이야. 하루 종일 햇빛이 들어오지. 그래서 옥상에 거울을 설치할 필요도 없어. 이른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옥상 농장에 다양한 채소와 꽃들을 키우고 있지. 마음이 심란하거나 심신이 피로할 때 옥상에 올라가 꽃들 보고 있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기분이 상쾌해져. 인류는 30만 년 전부터 식물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초록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건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야.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반려 식물 몇 개 옆에 두고 살면 정신 건강에도 아주 좋아.
기후 위기 시대에는 모든 식물들에게 큰절하면서 살아야 하네. 도시 옥상에서 자라는 식물뿐만 아니라 골목에서 만나는 잡초들에게도 고맙다고 인사해야 해. 지금 지구의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쉽게 줄어들지 않을 걸세. 탄소포집저장 기술은 아직 초보 수준이야.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나무를 더 많이 심는 것이지만 옥상이나 골목에 나무를 심을 수는 없어. 그래서 차선책으로 다양한 식물들이 어디에서나 살게 해줘야 해. 골목에서 자라는 잡초들이 지저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 통행에 지장이 없는 한 뽑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게 좋아. 그들은 적은 양이나마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일을 하거든. 지금 인류가 직면한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식물들을 많이 심고 길러야 해. 오직 식물만이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들에게 밥과 산소를 제공할 수 있거든. 우리 인간은 식물이 없으면 밥도 산소도 얻을 수 없는 매우 연약한 존재일 뿐이야.
책의 맨 마지막에 있는 시 <더 살아낸 뒤>를 함께 읽어 보세. 식물과 가까이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햇빛과 친해진다는 걸 잊지 말게. 늙은이에게는 햇빛이 생명이고 보약이거든. 어떤 방식으로든 남은 생을 꽉 껴안고 잘 살길 바라네. 이 세상 마지막 날 “충분히 살아냈어”라고 웃으면서 떠날 수 있게.
“더 살아낸 뒤/ 죽기 전의 순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인생을 꽉 껴안아보았어./ (글쓰기로.)// 사람들을 만났어./ 아주 깊게. 진하게./ (글쓰기로.)// 충분히 살아냈어./ (글쓰기로.)// 햇빛./ 햇빛을 오래 바라봤어.”
Copyright ⓒ 시사위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